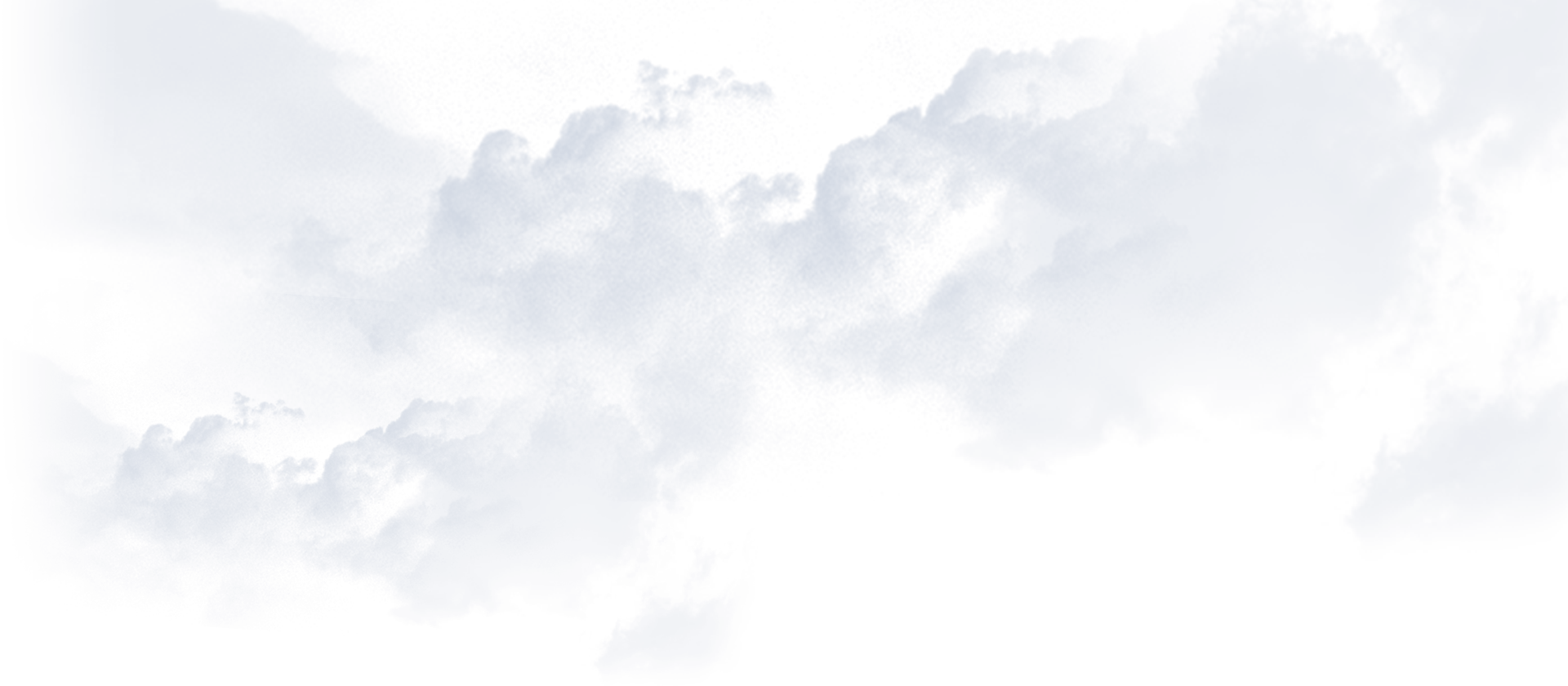“저 세상이지. 거길 가야해 이제.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편안하게 가 있으면 좋잖아.”
12월, 연탄내가 동네에 퍼지면 이상호(85) 할머니는 이 오랜 생각을 꺼내든다. 이 할머니가 가보고 싶은 곳은 새파란 바다도, 어릴 적 책에서 봤다는 프랑스도 아니다. 어느 날엔가 교회 목사님이 말했다는 하늘나라. 이 할머니는 꼬불꼬불한 경사길이 얽히고설킨 이 낡은 마을과 맞닿아 있는 ‘저 세상’ 하늘로 가는 게 어느 덧 늙은 꿈이 됐다.
104마을 주민 인터뷰 / 촬영·편집 = 강유진, 정은비
할머니는 적적하다. 그래서 20년 전 네 아들과 자신을 두고 눈을 감아버린 미운 남편이 있는 곳, 같이 화투칠 친구들이 먼저 가있을 그 곳이 그립다고 했다. 48년을 살아낸 12평 판잣집은 더 이상 이 할머니가 살아가고 싶은 쉼터가 아니다. 마을에는 이제 이 할머니의 늙은 푸념 하나 들어줄 동갑내기 친구도 가족도 남아있지 않다.
이 할머니는 “동네에 같이 늙을 친구들 하나 없어. 개발인지 뭔지 한다고 하니까 다 집 팔고 나갔어. 옆집에 살았는데 엊그제인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 갔다나 봐. 연 락이 없네”라며 괜스레 해져버린 다홍색 조끼를 만져댔다.
서울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있는 중계동 104번지, 일명 백사마을에는 할머니 80여 명이 산다. 마을은 1967년경 생겨났다. 당시 정부는 도심을 정비한다고 용산, 남대문, 종로 일대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했고 오갈 데 없어진 철거민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한 곳이 바로 백사마을이다.
이들은 낡은 천막 아래 분필로 선을 그어 네 집 내 집을 나눠가며 마을을 꾸려냈다. 두부 한 모 살 돈이 없던 주민들은 토끼길이라고 부르는 좁은 불암산 자락 오솔길에서 나물을 캐고, 땔감을 주워 생계를 꾸렸다. 그렇게 산지 40여 년이 흘렀다.
풍기기 시작한 때부터 마을은
깨지고 사람이 떠났다”
개발에 쫓겨 30대에 백사마을로 이주해온 이들은 어느 덧 칠순 넘긴 노인이 됐다. 길러낸 자식들은 서울 도시로 갔다. 나이 든 친구들끼리 앉아 명절에나 집에 오는 자식 흉보는 게 낙이었는데, 개발이란 악몽이 또 다시 힘없는 노인들을 덮쳤다. 마을 중턱에 구부정하게 서 담배를 태우던 하길남(78) 할아버지는 낡은 마을에 ‘돈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때부터 마을은 깨지고 사람이 떠났다고 했다.
백사마을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2000년대 들어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200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이듬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땅값이 오를 걸 기대한 집주인들은 돈 없는 세입자를 내보냈다. 검정 고급차를 끌고 온 외지인들이 낡은 집을 헐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이후 재개발 방법과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들 간 다툼이 벌어지며, 정작 재개발 사업은 물꼬조차 트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오순도순 달이 닿을 듯한 오르막길을 같이 오르던 백사마을 주민들은 갈라지고 흩어졌다. 한때 5000가구 주민들이 모여 살던 백사마을에는 이제 800여 남짓 가구만 남았다.
백사마을 노인들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다. 개발과 그에 따른 상실은 이들에겐 현재이자 과거다. 이들은 싸우지도 불평하지도 않는다. 다만 반평생을 같이 산 이웃들이, 튀긴 밀가루 국수를 나눠먹던 주민들이 다투는 모습이 안타깝고 버거울 뿐이다.
104마을 주민 인터뷰 / 촬영·편집 = 강유진, 정은비
50년째 백사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길자(68) 할머니는 “처음 철거돼 왔을 때는 불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호롱불 켜놓고 그랬어. 바닥은 어찌나 험한 지, 왕사모레라고 자갈같이 굵은 게 많았어. 넘어지면 다 깨지는 거야. 무릎이 성한 데가 없었어”라며 힘없이 웃어보였다. 그러더니 이내 “알고 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지금은 너무…”라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주변 집들을 가리켰다. 입으로 하나, 둘, 셋을 세다가 나중에는 “저 집부터 이 집까지”라며 쭉 선을 긋는다. 사람 없는 빈 집들이다. 어느 집은 녹슨 판자 아래 거미줄이 무성하고, 어느 집은 멀리서 봐도 폐허다.
김 할머니는 “이것도 빈 집 저것도 빈 집, 다 빈 집이야. 몇 집 건너서 한 집 꼴이야. 지금은 이제 사는 사람보다 빈 집이 더 많아. 길가에 가로등 하나 달렸는데 여름이면 다 나무에 덮여.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무섭거든 저녁이면”이라며 말없이 고개를 저어보였다.
백사마을과 생일이 같다는 마을입구에 자리한 부동산에 들어갔다. 화면이 노란 12인치 TV를 보고 있던 사장 김모(68) 할아버지는 대뜸 “뭘 또 불쌍한 사람들 얘기를 자꾸 물어봐”하며 손을 저었다. 그러더니 숫자 몇 개를 대뜸 읊는다. 백사마을 전세와 월세 가격이다. 전세 400만~1000만원, 보증금은 100만원에 월세 10만~15만원. 김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들 살 곳은 못 되지. 그러니 개발하려 하는 거지. 늙은 사람들이야 뭐”라며 연신 TV 채널을 돌렸다.
서울시는 1960년대 향수가 짙게 배인 백사마을의 모습이 재개발과정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주거 모습과 자연지형, 골목길 등은 유지하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 저층 임대주택을 짓고 신축 아파트와 공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가난한 노인들을 최대한 임대주택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용역 연구도 준비 중이다.
백사마을 노인들은 덤덤하다. 그러나 불안하다고 했다.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설명을 듣자하니, 40여년 전 백사마을로 쫓겨난 때가 떠오른다. 힘없이 쫓겨났던 옛날과 달리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고래고래 다투는 젊은 주민들 모습은 생경할 따름이다.
백발의 백사마을 토박이들이 바라는 건 재개발로 지어지는 그럴듯한 집도, 껑충 껑충 뛰는 집값도, 흙길을 갈아엎어 만든 아스팔트 도로도 아니다. 그들은 사람을 그리워했다. 연탄 하나 의지해 겨울을 나고, 화덕에 구운 고구마를 집집마다 나눠 먹을 수 있던 시절이 좋았다 했다. 백사마을 노인들이 두려운 건 가난이 아닌 무인(無人)이었다.
이제는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네들만 산다 이거야”
40년 전 백사마을에 이발소를 차린 현대이발관 사장님 이달수(74) 할아버지는 “옛날에는 살 맛 났었지. 이제는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네들만 산다 이거야”라며 이발소 바닥을 연신 쓸어댔다. 바닥에는 검은 머리 대신 백발만 한 웅큼 있었다.
재개발에 대해 물었다. 이 할아버지는 “그럼 이대로 사는 게 좋아?”라고 되물었다. 재개발이 되면 뭐가 좋을 것 같냐는 물음에는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개발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지”라며 웃어보였다. 동네에 나이 든 냄새가 나서 사람이 안 오는 것 같다며 쓸쓸히 미소 지었다.
김 할아버지는 “작가나 학생들이 사진 찍고 작품활동 하겠다고 많이 와. 여기 신문이고 라디오고 TV고 많이 나오잖아. 그럴 때는 구경거리 되는 거 같다고. 부끄러운 일이지”라며 “그래도 참 모르겠는 게. 연탄 나를 학생들이 드나들고 그럴 때는 ‘아! 여기도 사람이 좀 다니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라고 말했다. 백사마을에서 만난 노인들이 그랬듯, 그 역시 흘러간 옛 추억을 벗 삼아 적적한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윤성노 뜨거운청춘 대표 인터뷰 / 촬영·편집 = 강유진, 정은비
12월 21일 백사마을을 찾은 주거 문제 활동가인 윤성노 뜨거운청춘 대표는 “(백사마을은) 개발이 진행되다 엎어지다 했기 때문에 불신과 갈등이 상당하다. 이 지역만큼은 다른 지역 재개발과 다르게 가야 한다”며 “계속 쫓겨나고 쫓겨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상황이다. 누군가는 반기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살다 보니 세상을 체념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표는 “개발과 수익성이란 미명아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재개발) 수익이 누구에게 가는지 의심이 많이 간다.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10~15%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살던 사람들이 개발 이후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